페이지 안내
연구
연구성과
연구성과
연구성과 미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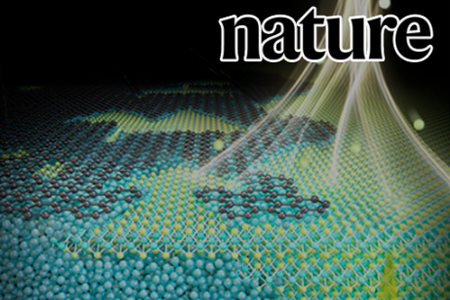
차세대 2차원 반도체 상용화 가능성 높인 반도체 합성 신기술 개발
재료공학부 이관형 교수팀
재료공학부 이관형 교수 공동연구팀이 다양한 기판 위에서 웨이퍼 면적의 단결정(single-crystal) 2차원 반도체를 직접 성장시킬 수 있는 신기술 ‘하이포택시(Hypotaxy)’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성과 게시판

세포핵의 형태를 유지하는 단백질인 라민의 고해상도 3차원 구조 밝혀
농생명공학부 하남출 교수 연구팀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심엔 유전물질인 DNA를 포함하는 세포핵에 있다. 라민(lamin)이라는 세포내 골격 단백질은 세포핵막 안쪽에 결합해서 세포핵의 모양을 유지하여 그 속의 DNA를 보호한다. 서울대 하남출 교수 연구팀은 인간의 라민의 3차원 구조를 고해상도로 규명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로부터 라민 단백질이 어떻게 세포핵의 모양을 지탱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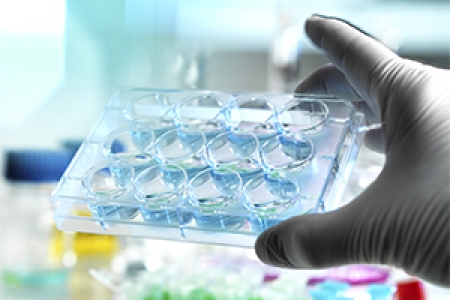
농생명공학부 최윤재·조종수 교수 연구팀, '다낭체나노입자 이용, 유산균에서 천연항균물질 증진 방법 개발'
항생제의 사용이 문제가 됨에 따라, 많은 연구진들은 차세대 항생제로 유산균, 바실러스 등에서 분비하는 천연항균물질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의과대학 성제경 교수-연세대-예일대 공동연구팀, 대사질환 관련 새로운 기전 규명
국내외 연구진이 공동연구로 지방세포(Adipocyte)의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는 새로운 기전을 규명하였다. 서울대학교 성제경 교수, 연세대학교 서준영 교수, 예일대학교 Peter Cresswell 교수 연구팀이 바이페린(Viperin) 단백질이 지방세포의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는 기작을 규명하고, 지방함량을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학계에서 우수성이 인정되어 생명과학 분야의 권위있는 학술지인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NAS) 온...

물리천문학부 우종학 교수 연구팀, 은하중심의 중간질량 블랙홀 최초로 발견
블랙홀의 기원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중간질량 블랙홀을 최초로 확인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학교 우종학 교수 연구팀은 1천4백만 광년 떨어진 왜소은하 NGC 4395 중심의 블랙홀 질량을 연구한 결과가 Nature Astronomy에 6월 10일자(영국 시간 기준, 한국시간 기준으로는 6월 11일 오전 01시)로 온라인 출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하 중심에 존재하는 블랙홀들은 태양보다 백만 배 이상 무거워 거대질량 블랙홀로 불리지만, 이번 연구는 그보다 백배 이상 가벼운 중간질량 블랙홀을 왜소은하 중심에서 찾아낸 결과다. 블랙홀의 기원은 블랙홀 연구의 주요한 과제...

지구환경과학부 이강근 교수 연구팀, 포항지진의 특징과 시사점에 관한 과학정책 논문 Science지에 게재
□ 요약내용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이강근 교수가 단장으로 활동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국내 및 해외 참여연구진으로 주요 저자를 구성하여 국제학술지 ‘Science’ 지에 “유체 주입으로 유발되는 지진 위험 관리 (Managing Injection-Induced Seismic Risks)” 제목의 과학정책 논문 게재 •포항지진이 기존의 경험 이론을 바꾸는 증거가 되었음. •포항지진이 물 주입과 이로 유발된 미소지진들에 의한 촉발 지진임을 재차 확인하고, 전세계에 포항지진이 주는 시사점과 교훈, 그리고 향후 위험관리의 방향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 •유체 주입량이...

생명과학부 이준호 교수, 환경 조건에 따른 유전체 변화 양상 첫 규명
"종의 기원"이 출간된 지 16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날에도 새로운 종이 어떻게 생겨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즉 진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는 궁극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생물학 질문임. 생물학적 종은 교배 후 생식 가능한 자손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하는 과정, 즉 종의 분화에 관한 연구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 중에서도 염색체 또는 유전체 (genome) 수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음. 본 연구에서는 예쁜꼬마선충 C. elegans이라는 같은 종에 속하지만 영국이라...

화학부 정연준, 재료공학부 이관형, 센트럴 플로리다대 정연웅 교수 연구팀 새로운 2차원 물질 개발 논문 ACS-AMI 저널 표지 선정
2차원 전이금속 디칼코게나이드(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 TMD)는 몰리브데넘(Mo), 텅스텐(W) 등의 전이금속 원소와 셀레늄(Se), 황(S) 등의 칼코겐 원소가 MX2 (M=전이금속, X=칼코겐 원소)의 형태를 이루는 새로운 2차원 나노물질이다. 2차원 TMD는 쌓여진 층수에 따라 에너지띠(energy band) 구조가 변화하여 전기적 특성이 달라지는 성질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소자로 활용하기 위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백금(Pt)과 셀레늄(Se)으로 이뤄진 2차원 PtSe2 물질은 높은 전하 운반...

물리천문학부 전헌수 교수팀, 무작위 레이저의 특성을 제어하는 원리 개발
□ 무작위 레이저를 체계적으로 제어 가능함을 시연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전헌수 교수 연구팀은 삼성전자미래기술육성센터의 지원 하에, 하향식으로 설계 및 제작이 가능한 무질서(disorder)한 광학계를 개발하고, 이를 무작위 레이저(random laser) 소자에 적용하여 레이저의 발광 특성을 체계적으로 제어하는데 최초로 성공하였음. ○이러한 성과는 무작위 레이저의 특성을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증명한 것이며, 향후 무작위 레이저의 성능과 활용성을 현저히 개선하는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됨. □ 단일모드 레이저를 구현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

생명과학부-보라매병원 공동연구팀, 퇴행성관절염 원인 밝혀
국내 연구진이 노화와 퇴행성관절염 간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밝혀내 관절염을 치료할 실마리를 찾았다. 국내 연구진으로 구성된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와 보라매병원 공동연구팀 (제1저자 강동현, 신중권 서울대 생명과학부 학생)은 그간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던 퇴행성관절염의 원인을 밝혔다. 이들은 활성산소에 의한 연골세포의 노화가 마이크로RNA의 한 종류인 miR-204를 증가시켜 연골이 퇴행된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냈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김진홍 교수 연구팀이 IBS RNA 연구단 김빛내리 단장,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강승백...

농생명공학부 최상호 교수 연구팀, 패혈증비브리오균 잡는 내성을 유발하지 않는 새로운 기술 개발
비브리오 패혈증은 패혈증 비브리오균(Vibrio vulnificus)의 감염에 의하여 유발되며, 치사율이 50%를 넘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수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에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패혈증 비브리오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섭취하거나 오염된 바닷물에 상처 부위가 노출되었을 때 감염되며, 발열,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신속하게 치료하지 못하면 패혈증 비브리오균이 전신에 퍼지고 급격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 빠르게 패혈증으로 진행된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최상호 교수 연구팀은 패혈증 비브리오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병원성...

조선해양공학과 조선호 교수 연구팀, 냉간용접 현상과 유전영동 제어를 통한 나노구조체의 제작
서울대 공과대학 조선호 교수 연구팀은 마이카 기저(mica substrate)*를 이용한 냉간용접(cold welding)과 유전영동(dielectrophoresis) 제어를 통하여 나노선(nanowire), 나노리본(nanoribbon), 나노잎(nanoleaf) 등 다양한 나노구조체(nanostructure)의 제작에 성공하였다. ○“나노제조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 냉간용접 현상의 규명”(2016년 9월 11일자 서울대 보도자료)에 이어 유전영동력 제어를 통한 나노제작으로 확장된 연구이다. ○냉간용접은 결함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으며, 용접 외 영역과 동일한 격자구조...

화학부 정연준 교수팀, 이온성 액체 슈퍼 커패시터의 작동원리 분자 수준 규명
최근 신재생에너지 관련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기에너지 저장장치의 개발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한 슈퍼 커패시터(super-capacitor)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출력 밀도가 높고 충·방전 속도가 빠르며 수명이 긴 장점을 가지고 있어 순간적인 고출력 에너지가 필요한 전자장치에서 활용되고 있다. 슈퍼 커패시터의 성능은 구동 전압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넓은 전압 범위에서도 화학적으로 안정한 이온성 액체를 슈퍼 커패시터의 전해질로 활용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전하를 띈 이온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