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안내
연구
연구성과
연구성과
연구성과 미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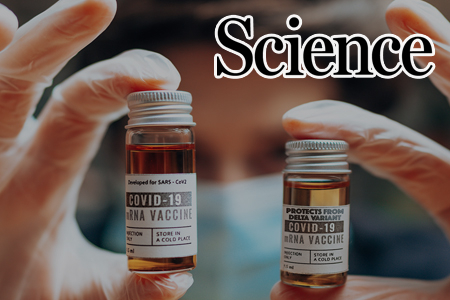
mRNA 백신 작동원리 세계 최초 규명
생명과학부 김빛내리 교수팀
새로운 치료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는 mRNA 백신을 더욱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실마리를 생명과학부 김빛내리 석좌교수 연구팀이 밝혀냈다.
연구성과 게시판

물리학부 박영우 교수팀, 나노 플라스틱 섬유서 ‘자기저항 0’ 현상 첫 발견
물리학부 박영우 교수팀, 나노 플라스틱 섬유서 ‘자기저항 0’ 현상 첫 발견 물리학부 박영우 교수팀이 나노 크기의 플라스틱 섬유에 자석을 가했을 때 자기저항이 영(0)이 되는 현상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혔다. 자기저항은 자기회로에서 전기저항력으로, 전기회로에서의 전기저항과 같은 것이다. 이번 연구 성과는 높은 자기장이 발생하는 자석을 과도한 전류가 흐를 때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는 스위치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자기 부상열차의 개발과 나노 섬유를 이용한 새로운 고집적 자기 메모리 디스크 개발 등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또 가볍고 유...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어본·일본어본 이어 칙유·각서까지 동일 필체”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어본·일본어본 이어 칙유·각서까지 동일 필체” 1910년 한·일병합 과정이 일방적·강제적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또 공개됐다.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한국병합조약의 양국 문서는 물론 이완용을 협정 전권위원으로 임명하는 ‘칙유(勅諭)’, 병합조약 체결을 양국이 동시 발표한다는 내용의 ‘병합조약 및 양국황제조칙 공포에 관한 각서(倂合條約及兩國皇帝詔勅公布覺書)’ 등 4종의 문서가 모두 같은 글씨체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4종의 문서 가운데 한국병합조약의 한국어본과 일본어본의 필체가 같음은 지난...

디자인학부 유리지 교수, 금속공예 ‘회고전’
디자인학부 유리지 교수, 금속공예 ‘회고전’ 금속공예가인 유리지 디자인학부 교수의 회고전이 서울대미술관(MoA)에서 열렸다. 1945년 경북 울진에서 태어난 유 교수는 서울대 응용미술과와 대학원을 나와 1970년대부터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현대 금속공예의 기반을 마련한 작가로 평가받는 유 교수의 40년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자리다. 유 교수의 70년대 작품은 인체 형상을 표현한 형태로 기능에 무게를 두면서 실용공예에 대한 실험과 탐색을 벌였다.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유 교수는 70년대 중반 이후 모더니즘을 수용하면서 현대 금속공예에 새로운 가능...

의학과 박성철 교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 ‘노화혁명’ 펴내
의학과 박성철 교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 ‘노화혁명’ 펴내 노년의 빛깔은 통상 '실버(silver)'로 정의되지만, 최근 '노화혁명'을 낸 박상철 교수는"노년의 빛깔은 능동적이고 찬란한 '금빛'"이라고 주장한다. "나이 들었다고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늙자"는 메시지를 담은 이 책은 그간 '100세인 이야기', '웰 에이징' 등의 저서를 통해 '장수인(人)' 이야기를 해 왔던 박 교수가 '고령화 사회'로 바뀐 관심사를 반영한 첫 책이다. 박상철 교수는 “미래사회의 고령화 대책은 노인들이 요양원이나 양로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더불...

기계항공공학부 김호영 교수팀,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노 도자기’ 빚어
기계항공공학부 김호영 교수팀,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노 도자기’ 빚어 “머리카락굵기 1000분의 1” 우리대학 연구팀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도자기’를 빚는 데 성공했다. 김호영 기계항공공학부 교수팀은 지름이 3μm(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인 도자기 형태의 구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구조의 지름은 머리카락 굵기의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김 교수팀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실 모양의 물질이 전자기장에 의해 동그랗게 말리는 ‘전기방사’ 기술을 사용했다. 고분자 용액에 전극을 꽂아 강한 전기장을 걸면 지름이 200nm(나노미터·1n...

규장각 송지원 연구교수, 조선시대 궁중음악 이야기 ‘장악원, 우주의 선율을 담다’ 펴내
규장각 송지원 연구교수, 조선시대 궁중음악 이야기 ‘장악원, 우주의 선율을 담다’ 펴내 땀과 恨으로 연주한 조선시대 악공들사극 ‘동이’에는 조선시대 궁중 음악기관이었던 장악원이 등장한다. 장악원의 두 악공(주식, 영달)은 극중 주인공인 동이의 든든한 후원자이면서 또한 임금 숙종의 술 친구 노릇도 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두 사람은 장악원 관리들에게 늘 업신여김을 당한다. 실제 장악원 악공의 모습을 어땠을까.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송지원 교수는 책 ‘장악원, 우주의 선율을 담다’ 에서 이렇게 말한다. “악공과 악생은 이른바 3D 직종의 하나로 여겨졌다. 그래서...

전기컴퓨터공학부 황기웅 교수, PDP 전력 및 밝기 등 효율높이는 신기술 개발
전기컴퓨터공학부 황기웅 교수, PDP 전력 및 밝기 등 효율높이는 신기술 개발 PDP(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 TV 소비전력을 반으로 줄이는 대신 밝기는 30% 정도 높일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됐다. 황기웅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최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미국 정보 디스플레이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초청 강연에서 현재 상용화된 PDP 효율을 크게 높이는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음극 물질을 채용해 높은 압력의 제논 가스를 쓰더라도 방전 전압이 낮아질 수 있어 고효율을 구현할 수 있다고 황 교수는 설명했다. PDP는 제논 가스로 제논 플라스마를 만들고...

의학과 유근영 교수팀, "콩 먹으면 위암 예방에 도움"
의학과 유근영 교수팀,"콩 먹으면 위암 예방에 도움"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들의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콩을 많이 섭취하면 위암이 예방된다는 사실이 국내 최초로 밝혀졌다.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유근영 교수팀(박수경 교수, 질병관리본부 고광필 박사)은 약 2만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콩의 인체 내 대사성분인 이소플라본 혈중 농도가 높은 경우 위암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1993년부터 함안 충주 등 4개 지역에 거주하는 건강한 일반주민 1만9688명에 대해 설문조사 및 혈액검사를 한 후 2003년까지 10년 이...

의학과 류인균 교수 연구팀
의학과 류인균 교수 연구팀"리튬이 뇌보호" 한·미 연구진이 조울증(양극성장애) 치료제의 오해를 벗겼다. 조울증이란 비정상적으로 들뜬 상태와 우울한 상태가 번갈아 나타나는 병으로 금속인 리튬을 통해 보통 치료한다. 그러나 리튬을 복용하면 지능이 떨어진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의사들이 처방한 리튬 약품을 환자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커져왔다. 류인균 교수와 김지은 박사, 미국 워싱턴대학의 스티븐 데이거(Dager) 교수팀은 조울증 치료를 위해 리튬을 복용한 환자 뇌를 관찰한 결과, 지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환자 뇌의 회백질을 관찰해 이뤄...

분당병원 정진행 교수팀, 폐암 악화 단백질 규명
정진행 서울대병원 교수팀, 폐암 악화 단백질 규명, 표적치료제 개발 가능 폐암을 악화시키는 단백질을 국내 연구진이 규명했다. 이로써 폐암 신약의 새로운 표적치료제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의 정진행 교수, 이현주 전임의 연구팀은 이 병원에서 수술받은 267명의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암 전이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단백질 `CD24`의 단백 발현을 면역조직화학검사 기법으로 검출해 분석한 결과 폐암 환자 87명(33%)에게서 CD24 과발현이 있음을 밝혀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세계폐암학회의 공식 학회지인 흉부종양학회지에 이달의 중요 논문...

기악과 최경환 교수 타악 독주회 열어
최경환 기악과 교수 타악 독주회 열어 "타악 연주자는 맨 뒷줄에서 클라이막스를 만드는 사람" 비록 오케스트라 맨 뒷줄에 서 있지만 타악 연주자는 교향악의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팀파니와 큰북, 드럼, 공이 울려퍼지는 웅장한 찰나를 위해 현악기와 관악기 연주자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선율을 만들어온 것 같다. 최경환 교수도 이 순간에 감동해 타악 연주자의 길을 선택했다. 원래 작곡과에 재학 중이던 그는"오케스트라 연주의 클라이맥스를 터트리는 팀파니 소리에 반해 전공을 바꿨다"며"그러나 이렇게 연주가 어려운 줄 몰랐다"고 말했다. 타악...

약대 강창율 교수 연구팀, 알레르기 치료 새길 열어 알레르기 유발 세포(Th2 세포)를 면역 세포(조절 T세포)'로 전환 성공
약대 강창율 교수 연구팀, 알레르기 치료 새길 열어 알레르기 유발 세포(Th2 세포)를 면역 세포(조절 T세포)'로 전환 성공 지금까지 병을 치료하는 방식은 질병을 일으키는 세포를 없애는 것이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포를 몸에 유익한 세포로 전환한다면 어떨까? 질병치료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국내외 연구진이 인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말썽꾸러기' 세포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세포로 바꿀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진딧물, 꽃가루 때문에 생기는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알레르기 증세는 진딧물, 꽃가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