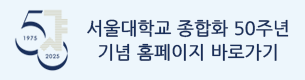‘예술사회학을 지나야 예술철학이 나온다-작가편’ 전시가 지난달 10일까지 서울대학교미술관에서 개최됐다. 전시 기간에는 강연과 라운드테이블 등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전시는 예술이 생산, 분배, 소비, 재창조되며 사회와 맺는 관계에 주목해 눈길을 끌었다. 전시연계 프로그램에서도 전시의 주제에 발맞춰 작품을 창조하는 작가의 삶, 세상과 예술의 대화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예술사회학을 지나야 예술철학이 나온다-작가편’ 포스터
예술은 더 넓은 문화적‧역사적 힘의 산물
‘예술사회학을 지나야 예술철학이 나온다-작가편’은 지난 6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전시는 예술이 사회‧정치‧경제적 구조와 관련되고 반영되는 방식과 이러한 거시적 구조가 예술적 표현을 형성하는 방식을 이해하려는 취지로 기획됐다. 서울대학교미술관은 예술 작품이 개인의 창조적 표현인 동시에 더 넓은 문화적, 역사적 힘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번 전시의 기획 의도인 것이다. 전시의 구성은 크게 ‘예술제도’와 ‘예술교육’으로 이뤄졌다. ‘예술제도’에서는 예술계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이 작동하는 방식을 드러내거나, 기존의 제도를 탈피하는 작품들이 마련됐다. 이어 ‘예술교육’에서는 현대미술에 대한 인식으로 직결되는 미술 교육 또는 교육으로서의 미술에 대한 작가의 고찰을 드러내는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코어라운지를 시작으로 미디어랩과 각 전시실에 각종 설치미술과 영상, 회화, 조각 작품이 빼곡하게 전시돼 다채로운 감상을 할 수 있었다.
허보리 작가의 ‘42개의 봄조각’은 작가가 스스로 제작한 42개의 작품 중 판매된 작품의 판매 장소, 일시, 전시장, 금액을 기록해 경제적 구조 안의 예술의 모습을 보여줬다. 정정엽 작가의 ‘나의 작업실 변천사’는 32년에 걸쳐 열 번 넘게 작업실을 옮기며 예술 활동을 한 작품을 생산하는 작가의 삶이 실제 현실과 동떨어진 것일 수 없음을 각인시켰다. 직업인으로서의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던지는 듯한 김영규 작가의 ‘미술 작가 생활 십계명’이나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한 ‘예술가직업훈련학교 신청서’ 등의 작품 또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예술사회학을 지나야 예술철학이 나온다-작가편’ 전시 사진
작품 너머 예술의 현장을 둘러보다
지난 8월 18일에는 전시연계 프로그램으로 강연과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다. 오후에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은 ‘예술과 예술가: 예술, 무엇을 위한 진동인가?’를 주제로 이뤄졌다. 첫 발표를 맡은 김달진미술연구소 김달진 대표는 작품이 전시되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김 대표는 공·사립 박물관과 미술관뿐만 아니라 비엔날레, 아트페어, 옥션 등 우리가 예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경로가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훌륭한 작품이라도 전시되고 감상돼야 작품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라며 창작, 전시, 감상, 판매/대여로 구성되는 예술 작품의 생애주기를 자세히 소개했다. 또한, 작품을 생산하는 작가, 유통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매개자(중개자), 작품을 구입하는 소장가(소비자) 각각의 역할을 상세히 소개하며 활발한 미술시장을 위해 세 주체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여러 미술작품을 수집, 보존, 연구하는 새로운 아카이브 개념이 확산돼 미술 주체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작가의 독창적인 작품세계가 발전하기를 바란다”라며 발표를 마쳤다.
이어 김희영 교수(국민대학교 미술학부)가 두 번째 발표를 맡아 예술 개념에 얽힌 역사적인 이야기를 들려줬다. 김 교수는 “예술사회학과 예술철학 그리고 예술작품 간의 관계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예술의 본질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게끔 한다”라며 이번 전시의 주제를 되짚었다. 김 교수는 경쟁적‧체계적인 구조의 현대 사회에서 소비되고 향유되는 예술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작가와 작품에 대해 일반 대중이 가지는 비평 의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예술을 대할 때 필요한 몇 가지 관점을 제시했다. 그중 하나는 무수한 매체들이 활용되는 상황에서 형식보다는 작품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작가가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자들의 어떤 경험을 확장하고 싶은 것인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작품이 생산되는 시대적 배경도 함께 읽어낼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며, 절대왕정 시기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된 루이 14세의 초상화와 관습적이고 형식적인 예술사조를 풍자한 뒤샹의 샘(Fountain)을 예시로 들었다.
라운드테이블의 마지막 발표자는 이번 전시에 참여한 김문기 작가였다. 주로 조각 작품을 제작하는 김 작가는 전시를 준비하며 겪었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과정을 발표의 주제로 삼아 한국에서 작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게 했다. 김 작가는 작업 재료 준비, 작업 공간 선정, 작품 운송, 작품 보관의 각 단계에서 조각의 특수성으로 인해 많은 제약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김 작가는 “마땅히 작업할 수 있는 작업실이 없어 주거 공간인 원룸에서 조각 작품을 만들기도 했다”라며 “물리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 원룸의 크기가 조각의 크기를 결정하기도 했다”라고 어려움을 전했다. 또,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아 구겨지거나, 접을 수 있는 작품을 주로 만들게 된다”라고 덧붙이며 주어진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나가는 즐거움을 얻기도 한다고 말했다.

전시연계 프로그램 라운드테이블 토론자들
이번 전시와 연계 프로그램은 작품의 경계를 넘어 예술과 사회가 만나는 지점에 주목했다. 예술은 종종 현실과 동떨어진 관상품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실은 우리 주변의 삶과 이야기를 가득 담은 지극히 사회적인 고민의 산물이다. 예술사회학의 경유지들을 지나야 가치의 긴장 안에서 진동하는 사유로 상승하는 길이 나온다는 심상용 관장의 설명처럼, 예술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확장할 시간이다.
서울대학교 학생기자
김규연(정치외교학부)
rbdus7522@snu.ac.kr